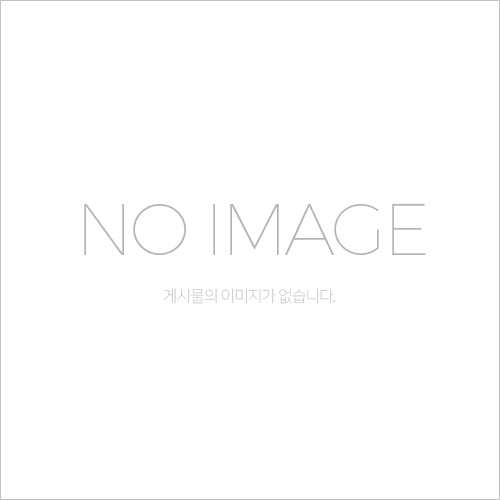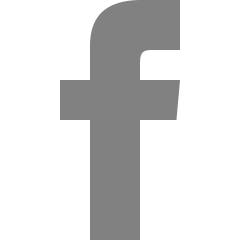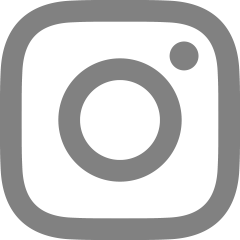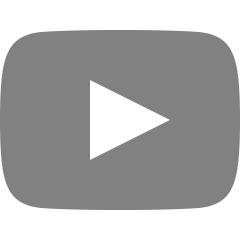[NETWORK] Computer Network - Week 1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 1주차에서는 1.1 ~ 1.4의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1.1 what is the Internet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ost = end systems = client
모두 동일한 의미이다. Host란 pc, server, wirless laptop, smartphone과 같은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network apps 는 흔히 우리가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이용하는 어플들이나 웹 브라우저와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communiaction links는 간단히, 네트워크를 통하는 장치들을 연결해 주는 연결 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선 or 유선)
bandwidth 는 transmission rate 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비트가 단위 시간당 얼마나 보내느냐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하자.
bits per second로 줄여서 bps라고 한다. 1 Mbps 처럼 컴퓨터를 만져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 쯤은 봤을 법하다.
router 는 쉽게 말해 데이터의 경로를 결정해 주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Internet이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은 네트워크들이 모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protocol은 아래에서 제대로 설명하겠다.
네트워크는 전세계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일이 돼야한다. 국제표준기구인 IETF에서 표준을 정한다.

protocol이란 쉽게 생각하면 약속이다.
protocol은 format과 order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래 그림을 보자.

이렇게 사람이 대화하는 형식처럼 네트워크도 저런 형식을 지정해주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protocol이다.

이제부터 1.2 network edge에 대해 알아보자.
1.2에서는 end systems, access netwroks, links에 대해서 알아본다.

network edge란 네트워크에서 가장 끝 부분을 말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PC 와 같은 Host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edge network는 뭘까? 헷갈리면 안된다. edge network는 네트워크에서 가장 끝에 있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그 네트워크를 Access network 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접속망이라고 한다.
저기 위에 그림에서 mobile, home, institutional 네트워크들이 바로 접속망이다.
쉽게 생각하여 우리가 집에서 공유기나 랜선을 통하여 제일 처음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access network라고 생각하면 된다.
network core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

우리의 end systems 즉, 스마트폰과 같은 Host들을 어떻게 edge router에 연결할 수 있을까?
edge router는 쉽게 생각하여 공유기라고 생각하자. 공유기도 일종의 router이다.
집에서는 residential access network를 설치하고,
회사에서는 institutional access network를 설치하고,
기지국 같은 곳에는 mobile access network를 설치하여 edge router에 연결한다.
bandwidth는 단위 시간당 비트를 얼마나 보내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다.
access network를 사용하는 즉, 우리 집의 공유기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달라진다.
bandwidth는 shared 방식과 dedicated 방식이 있는데 전자는 주로 인터넷에서 택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전화에서 택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shared 는 공유하는 것이므로 사용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연결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dedicated는 resource라는 것을 할당하여 사용한다. 즉, 사용할 양이 고정적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전화는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해서 일정한 bandwidth가 주어지는 dedicated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Access network에 대해서 알아보자. 접속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두 가지 모뎀을 알아보자.
우선, DSL부터 알아보자.
DSL modem은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모뎀이다.
우리 집에 있는 전화기, 인터넷, 테레비는 모두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하지만 전화는 말했다시피, dedicated 이고 인터넷은 shared 라고 했다.
이 둘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주파수에 실어서 보내야한다.
다른 주파수에 실어서 보내면 전화 데이터는 telephone network로 가고 인터넷 데이터는 ISP라는 곳으로 간다.
ISP에 대한 설명

두 번째로 설명할 모뎀은 바로 Cable 모뎀이다.
cable 모뎀은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다.
비트들은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파형으로 보내진다.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를 섞어서 보내면 수신하는 곳에서 분리가 가능하다.
이것을 바로 f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라고 한다.
그래서 티비, 인터넷, 전화 등의 신호들을 모두 섞어서 보낸다.
channel 은 티비에서의 채널과 같이 생각하면 된다. 각각의 채널은 모두 주파수가 다르다.
그림에서 1 ~ 9번 채널은 비디오, 데이터 등 다른 주파수들을 섞어서 보낸다.

이제는 Access network의 home network에 대해서 알아보자.
홈 네트워크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접속망이다.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겠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WI-Fi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Host들은 위의 공유기를 통하여 네트워크에 접근한다.
(유선 Host는 공유기 없이 바로 Router로 연결)
이 공유기는 일종의 라우터인데 이 공유기도 라우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라우터를 지난 데이터는 모뎀을 거쳐서 headend 나 central office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한 줄로 설명하자면 이렇다.
Host -> wireless access point(공유기) -> (router, firewall, NAT) -> ( Cable or DSL )modem -> ISP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무선은 최대 54 Mbps의 속도가 나오고 유선은 최대 1 Gbps라는 속도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빠른 인터넷을 원한다면 유선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알아 볼 Access network는 바로 Ethernet이다.
이더넷이란 회사나 학교에서 많이 쓰는 접속망이다.
위의 그림의 유/무선 Host의 접근 과정을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Wireless version) Host -> access point (공유기) -> Ethernet switch -> router -> ISP
(Wired version) Host -> Ethernet switch -> router -> ISP
switch는 router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Ethernet은 초창기에는 10Mbps에서 시작 했지만 현재는 속도가 매우 잘나와서 Enterprise에서만 쓰이다가 지금은 국가기관망에서 사용한다.

Wireless access networks의 예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Wi-Fi를 들 수 있다.
접속망에 접근하는 과정은 이렇다.
end systmes -> access point -> router -> (ISP, Internet)
802.11b/g/n 으로 Wi-Fi가 고정되어 있다. 옛날에는 속도 11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450보다 더 성장했다.
wide-area wireless access는 기지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파트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자.
패킷에 대한 설명인데 패킷은 쉽게 말해 네트워크에서 전송하는 데이터를 패킷이라고 부른다.
숙지하고 오자.
2020/09/01 - [NETWORK] - [NETWORK] PACKET
[NETWORK] PACKET
| CONTENTS - PACKET - PACKET TRANSMISSION DELAY | PACKET PACKET : OSI 7계층 중 3층인 Network Layer의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PDU)이다. Host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이 있는데, 전송하려는 데이터를..
freeservice-son-of-programming.tistory.com

Physical media란 물리적인 연결을 하는 아이들로 생각하면 된다.
그림과 같이 두 가지가 있는데 coaxial 과 fiber optic 케이블들이 있다.
Coaxial cable은 텔레비전 뒤에 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TV에 꼽혀 있으니 건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Physical media이다.
fiber optic cable은 흔히 말하는 광케이블이다. 빛을 이용해서 쏘는 것인데 에러가 적고 주로 장거리에 이용한다. 건물 안 -> 밖으로 연결.

이제부터는 1.3 network core에 대해서 알아보자.
1.3 network core 파트에서는 packet switching, circuit switching, network structure를 알아본다.

network core는 위의 그림과 같이 라우터들이 모인 부분이다.
이 네트워크 코어는 많은 edge network들을 연결해 준다. 우리의 Home network와 같은 것들을 말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패킷을 보내는 두 가지 방식을 알아볼 것이다.
하나는 packet switching 이고, 또 다른 하나는 curcuit switching이다.
우선 packet switching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packet switching은 주로 인터넷 데이터를 보낼 때 사용하는 패킷 전송 방식이다.
packet switching에는 store and forward라는 용어가 있는데, 말 그래도 패킷을 저장하고 전송한다는 뜻이다.
네트워크에서 모든 패킷은 패킷 단위로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패킷을 라우터에 전부 store하고 나야지 그 다음 패킷을 forward할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는 한 패킷마다 L개의 bit를 가지고 있다.
link의 bandwidth는 R bps 이므로 패킷 전송 딜레이는 바로 L/R 이다.
Host 에서 Host까지 가는. 시간은 = 2 * L/R 이다.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0이라고 가정한다는데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겠다.)

패킷 스위칭에는 Queueing delay와 loss라는 개념이 있다.
Queueing delay란 쉽게 말해 Queue라는 곳에 패킷이 쌓여서 delay가 생기는 것이고, loss는 Queue에 패킷이 쌓여 패킷이 더 이상 큐에 패킷을 저장하지 못해
서 손실되는 현상을 말한다.
큐잉딜레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Queue를 알아야 하는데, 큐란 라우터의 메모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A와 B에서 보내는 패킷은 라우터에 도착할텐데, 각각에서 라우터까지 보내는 시간을 Arrival rate라고 하자.
라우터는 받은 패킷을 Output link를 통해서 패킷을 전송할 것이다.
그런데 이 Output link의 전송 속도가 Arrival rate보다 느리다면 라우터의 큐에 패킷들이 쌓일 것이다.
큐에 패킷들이 쌓이는 현상을 큐잉이라고 하는데 이 큐잉으로 인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지연이 생기는 것을 Queueing delay라고 한다.
이 Queue에 패킷이 쌓여 더 이상 패킷을 받지 못하면 도착한 패킷은 손실된다.
그렇다면 Queue의 길이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딜레이 시간이 너무 길어져 차라리 버리는게 낫다.

Network core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바로 routing과 forwarding이다.
router에는 routing algorithm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routing algorithm은 라우터에 들어오는 패킷들을 패킷의 header value에 적혀 있는 주소에 맞는 output link로 전송해 준다.
라우터에 들어오는 패킷의 경로를 결정해 주는 기능을 바로 Routing이라고 한다.
그리고 결정된 경로에 맞는 Output link로 패킷을 옮기는 기능을 바로 Forwarding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circuit switching에 대해서 알아보자.
packet switching이 shared 방식이라면 circuit switching은 dedicated 방식이다.
circuit switching에서는 source와 destination 사이의 resource를 할당해 버린다.
이 말 뜻의 의미는 bandwidth를 고정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Bandwidth를 고정하면 사용자의 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queueing delay도 없고 중간에서의 손실도 없다.
그러나 항시 정해져 있는 만큼 할당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낭비가 된다.
그렇다면 계속 패킷을 주고 받아야하는데 그래서 이 방법은 dedicated인 전화에 사용된다.

Circuit switching 에서 resource를 주는 2가지 방법
1. FDM
Home network처럼 주파수를 쪼개서 하나씩 주파수 resoure를 나눠준다.
파란색 사용자는 파란 주파수를 사용해서 전화를 한다.
전화국에 들어가는 회선에는 4명의 주파수가 섞여서 들어간다.
2. TDM
시간마다 쪼개는 것인데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Packet switching 과 Circuit switching 중 어느 것이 더 인터넷에 적합할까?
바로 Packet switching 이다.
이유는 Circuit switching은 리소스가 할당되어 정해진 bandwidth 때문에 사용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packet switching은 리소스가 할당되지 않아 여러 명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럼 packet switching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
packet switching은 bursty한 data에 좋다.
bursty한 data란 패턴이 없는 데이터를 말하는데 인터넷이 그렇다. 사용자가 이용할 때는 데이터를 보내고 안할 때는 보내지 않는.
그래서 resource를 sharing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혼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바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엄청 많을 때 queueing delay와 loss가 엄청나서 퍼포먼스 저하를 야기한다.
그럼 인터넷에서 하는 전화인 VoIP는 어떻게 할까?
VoIP는 인터넷이여서 packet switching인데 circuit처럼 흉내를 낸다.
그래서 스카이프나 디스코드와 같은것은 사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조금씩 끊긴다.

지금부터는 인터넷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자.
각각의 접속망이 서로서로 연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N의 제곱 만큼 시간이 걸려서 엄청나게 느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ISP라는 것을 통해 각각의 접속망을 연결해 준다.
ISP는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약자로 쉽게 생각해 SKT, LG와 같은 통신사로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하나로하면 ISP가 힘들어할 테니 여러개로 만들어주자!

ISP를 여러 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각각의 ISP들은 IXP라는 라우터로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regional ISP도 만들어 준다. 이것은 수원, 서울 처럼 지역 ISP이다.
그리고 Content provider network는 바로 구글에서 이용하는 유튜브 같은 컨텐츠들을 제공해주는 네트워크이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의 구조는 이런 식이다.
Tier 1은 국가기관망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KT는 옛날에 우리나라의 국가기관망이었다.
1.4에 대한것은 다음에 포스팅하겠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꼭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성장합시다.
'NETWOR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NETWORK] IPv4와 IPv6의 특징 (0) | 2020.09.07 |
|---|---|
| [NETWORK] PACKET (0) | 2020.09.01 |
| [NETWORK] OSI MODEL (0) | 2020.09.01 |
| [NETWORK] 공유기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호스트 확인하기 (0) | 2020.09.01 |
| [NETWORK] HOST && PART (0) | 2020.09.01 |